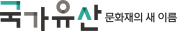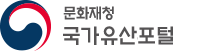국가유산 검색
국가무형유산
완초장 (莞草匠)Wanchojang (Sedge Weaving)
| 분 류 | 무형유산 / 전통기술 / 공예 |
|---|---|
| 지정(등록)일 | 1996.05.01 |
| 소 재 지 | 인천광역시 |
| 관리자(관리단체) 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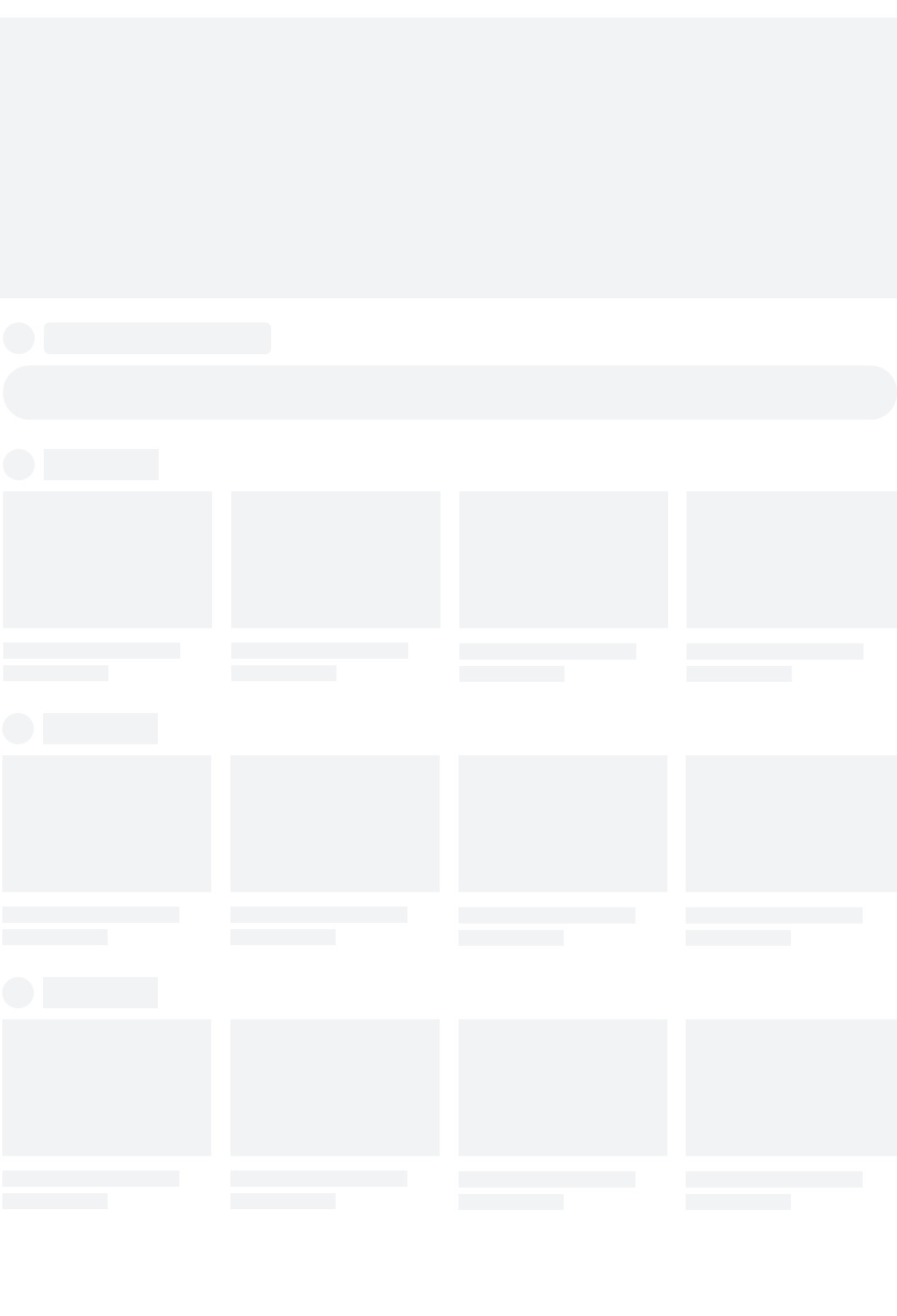

국가무형유산
완초장 (莞草匠)Wanchojang (Sedge Weaving)
| 분 류 | 무형유산 / 전통기술 / 공예 |
|---|---|
| 지정(등록)일 | 1996.05.01 |
| 소 재 지 | 인천광역시 |
| 관리자(관리단체) 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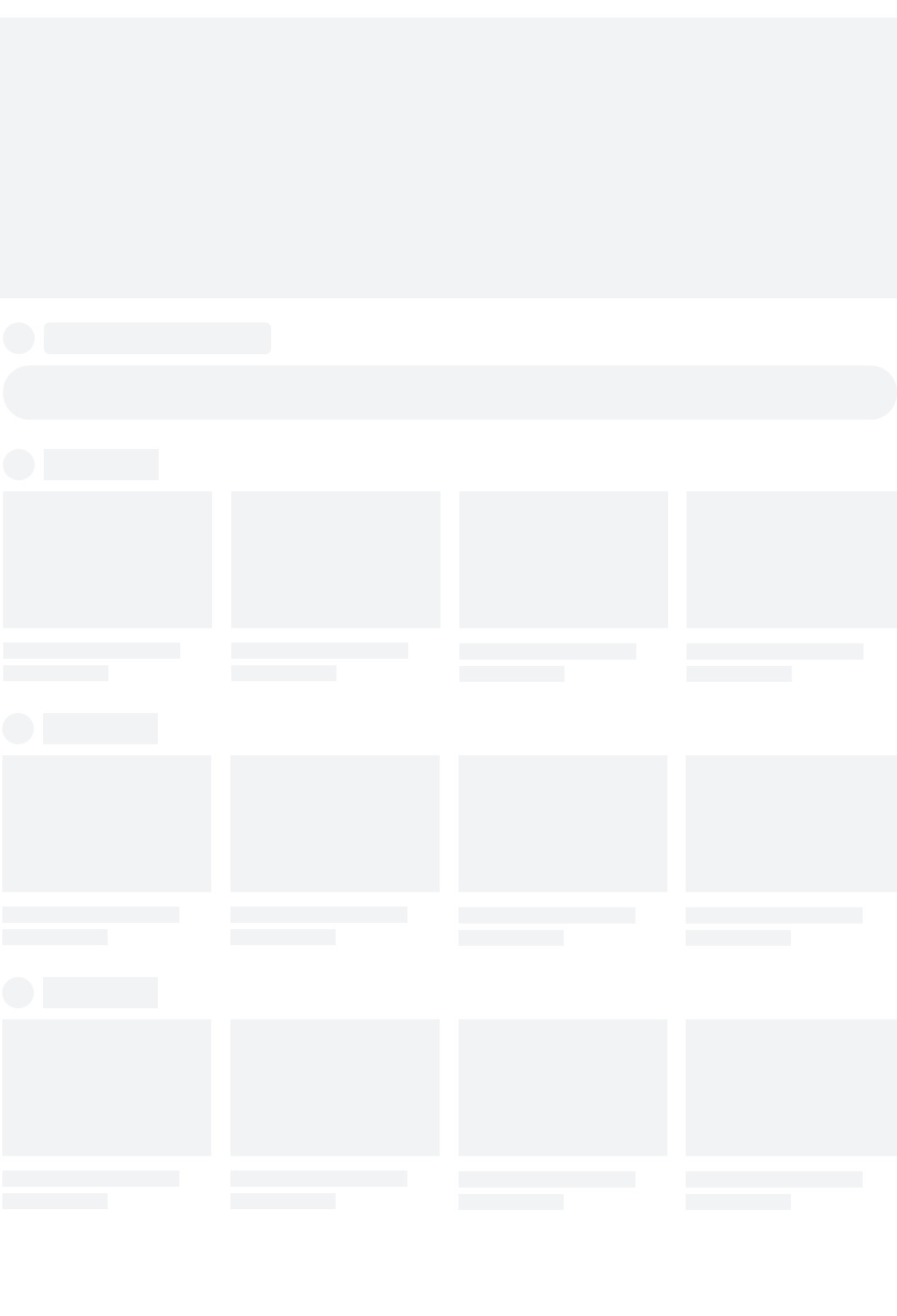
ⓒ 2000. KOREA HERITAGE SERVICE. ALL RIGHTS RESERVED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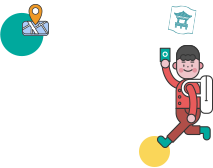
 국가유산
국가유산